[이효성의 시사칼럼] 우리 북방정책의 새로운 기회
2025-03-16
이를 위한 기초 인프라의 하나인 전력에 관해서는 앞서의 글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나머지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기초 인프라인 통신, 특히 5세대(5G SA) 이동통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인공지능을 비롯해 디지털 시대에는 거의 모든 것이 이동통신에 의존한다. 디지털 방식의 이동통신은 그 자체가 거대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다른 산업들도 그것을 활용해 생산 활동을 하거나 상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인다. 따라서 이동통신은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초적인 인프라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통신이 아날로그였던 1세대(1G, 1984년) 이동통신에서는 추종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통신이 디지털로 바뀐 2세대(2G, 1996년) 이동통신부터 한국은 주요 역할을 하거나 세계 이동통신을 선도했다. 2G에서는 유럽의 시분할 다중접속(TDMA) 방식에 맞서 보안과 통신품질에서 더 우수한 미 퀄컴사의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방식을 채택해 그 국제화에 기여했고, 3세대(3G, 2003년)에서는 피쳐폰으로 그리고 4세대(4G, 2011년)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단말기와 서비스 시장을 주도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에는 모바일 와이맥스(Mobile WiMAX) 또는 와이브로(WiBro)라는 이름의 무선 기술을 개발해 야심차게 4G의 국제 표준화 노력을 벌이기도 했으나 아쉽게 유럽이 주도한 LTE 기술에 패배했다. 그리고 5세대(5G NSA, 2019년)에서 한국은 세계 최초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처럼 통신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2G부터 5G 초기까지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표준을 채택하기도 하고, 표준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 소형의 모바일 폰들을 제조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으로 국제 이동통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아날로그 통신 시대에는 통신 후진국이었으나 통신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화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서둘렀던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유선과 무선의 디지털 통신망을 갖게 되었고 디지털 시대를 맞아 그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통신 기술과 사업이 붐을 이룰 수 있었다.
이동통신은 말할 것도 없이 무선통신 기술에 의해 이뤄진다. 그러나 무선통신이라고 해서 통신의 두 지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선으로 연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부분의 거리는 유선통신에 의하고 마지막 끝부분에서만 무선통신을 이용한다. 예컨대 서울의 ‘가’라는 이와 부산의 ‘나’라는 이가 스마트 폰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로 통신을 하는 경우, 서울과 부산까지의 대부분의 거리는 유선통신망을 활용하고 나머지 서울과 부산의 유선망의 끝단에서만 무선통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선통신의 시대에도 촘촘히 잘 갖추어진 효율적인 유선통신망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이 유선통신망에서도 효율적인 광케이블로 전국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망을 구축했다. 유선통신망의 경우, 과거에는 전기신호를 이용하는 구리선을 이용했으나 오늘날은 대체로 광신호를 이용하는 광섬유선(광케이블)을 이용한다. 광케이블은 구리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정보(초당 100기가 비트 이상)를 더 빠르게(광속으로), 더 멀리(수십-수백㎞), 그리고 전자기의 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광케이블은 인터넷의 백본망, 산업 자동화, 해저 케이블, 데이터 센터, 철도 및 항공의 통신 시스템 등에 활용된다. 말하자면, 광케이블은 인터넷이나 산업의 자동화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시대의 기초 인프라가 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광케이블로 촘촘한 전국망을 구축했기에 전국 어디서나 고속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광케이블은 고가여서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고, 민감한 장비여서 그 유지, 보수, 관리에 상당한 기술이 요구된다. 많은 나라에서 광케이블을 필요한 만큼 깔지 못하는 이유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광활한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비교적 적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조차도 광케이블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우리가 정보통신(IT) 산업과 디지털 시대를 앞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전부터 해오던 광케이블망 구축 작업을 김대중 대통령 때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지역에 촘촘한 광케이블망의 구축했고, 그 망을 이용한 정보통신 사업들을 대거 육성한 덕택이다. 이 앞선 광케이블망을 활용해 우리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산업과 디지털 경제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다.
덤으로 한국은 광케이블과 그 부대 장비의 생산 그리고 광케이블망의 설치 및 그 유지, 보수, 관리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망의 설치와 이동통신 기술, 그리고 모바일 폰의 제조와 콘텐츠를 비롯한 서비스 등으로 한국은 세계 이동통신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런 빛나는 전통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5G 이동통신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기는커녕 현실에 안주해 거의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의 이동 통신은 5G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초의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아쉽게도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이 그 시작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5G는 온전한 5G가 아니라 불완전한 것인데도 온전한 5G로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이다. 그러는 사이 중국은 국가 지원에 의해,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제4이통사를 통해 기존 통신사들이 온전한 5G를 발전시키도록 자극해왔다. 2022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111개의 이동통신사가 이미 온전한 5G로 전환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5G 이동통신은 5G라는 이름으로 불리고는 있지만 이는 온전한 5G가 아니라 4G와 5G의 중간 단계의 것일 뿐이다. 이동통신은 코어망(핵심망, Core Network)과 기지국으로도 불리는 접속망(Access Network)으로 구분되는데 우리의 5G는 코어망은 4G(LTE)인 채로 접속망만 5G(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이다. 이런 중간 단계의 5G의 정식 명칭은 5G NSA(Non-Stand Alone)로 불린다. 이에 비해 코어망과 접속망 모두가 5G인 온전한 5G는 5G SA(Stand Alone)로 불린다. 5G NSA도 4G보다는 더 많은 대용량의 정보를 더 빠른 초고속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뿐이다. 5G의 본연의 초저지연, 대량접속,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의 기능에 의해 인공지능 접목과 그 활용, 완벽한 자율주행, 드론과 로봇 등 수많은 기기들의 통합적 운용, 대규모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팜의 운영, 주파수를 가상으로 나눠서 사용함으로써 주파수의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하는 효율적 활용 등은 코어망도 5G일 때만 가능하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려면 이런 5G 고유의 장점들도 가능해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도 하루빨리 5G NSA에서 5G SA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장점들을 더욱 발전시킬 6G에로의 진화도 가능하다. 그 전환은 통신사와 통신을 이용하는 산업에도 새로운 사업과 이윤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 전환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이고 미래의 먹거리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전환은 기존 통신사의 투자, 구조, 운영, 인력 등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기에 저항이 따를 것이다.
그렇다고 계속 더 머뭇거리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선도해왔던 디지털 세상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에서 뒤처지게 된다. 그것은 곧 거의 모든 산업에서 뒤처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 새로운 정부는 이 문제를 아는 듯, 5G S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차질 없이 즉각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서도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앞서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효성 주필·전 성균관대 언론학과 교수·전 방송통신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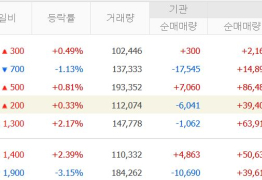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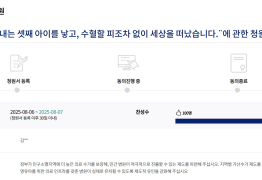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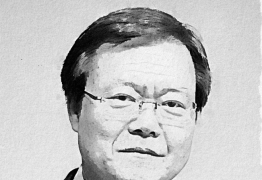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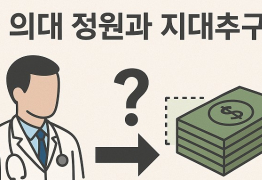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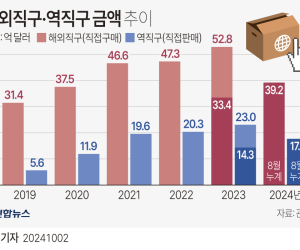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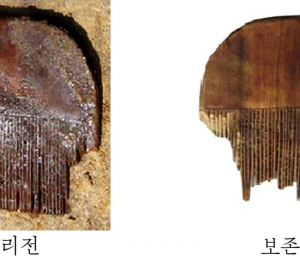








댓글
(0) 로그아웃